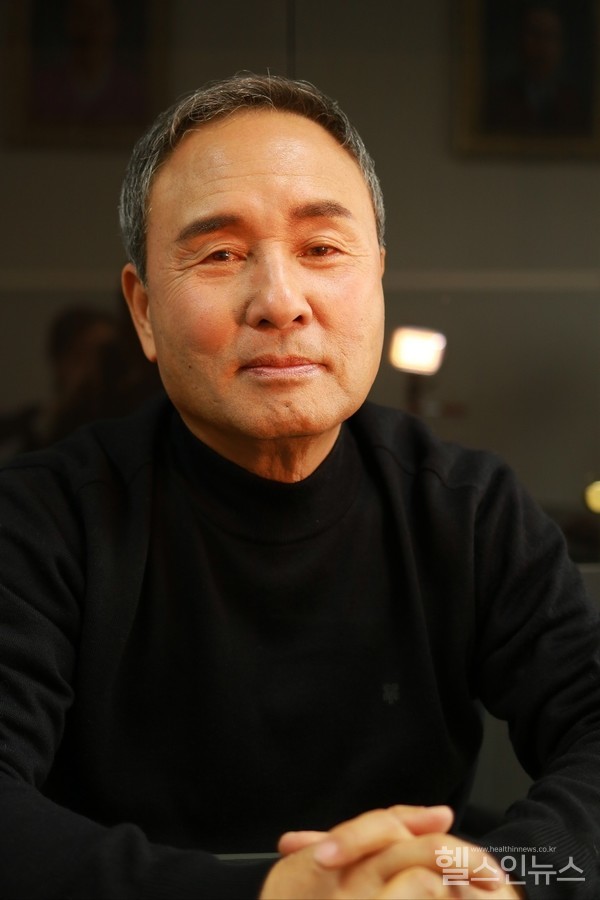
3년 전부터 별 일이 없으면 32년간 교수로 봉직했던 단국대학교에 1주일에 3~4일 간다. 평생교육원 자원봉사 때문인데 보통 오전에 하루 가면 2~3시간 동안 수강생들에게 테니스를 지도하기도 하고 이들과 경기를 즐기기도 한다. 허리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가급적 경기를 삼가하는데 참다 못해 한 두 경기 하고 나면 기분은 업 되는데 저녁에 잠 잘 때면 역시 불편하다. 언제까지 봉사할지 모르지만 운동도 그렇고 운동 후 가끔 함께 하는 점심 식사는 즐겁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참 좋아했다. 하는 것도 좋았고 보는 것도 좋았다. 운동을 아주 잘 한 건 아니지만 초, 중, 고 시절 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곤 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75년에 오류동 럭비 전용구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강의를 빠지고 하루종일 럭비 경기를 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교 4학년 때는 동기들과 장충체육관에 서울대 농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ROTC 2년차 때라 사복에 머리가 짧기도 했고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서 동기들과 낮술 한 잔 걸친 터라 반값인 중고생 표를 구입해서 들어가다가 표 받는 아저씨한테 걸려서 모두가 엄청 창피를 당했다. 장난이었지만 야단맞을 짓을 자초했다.
대학 입학 후 명문 하키부에 들어가 공부가 바쁜 틈에도 연중 모든 대회에 참가했고 군 복무 후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6년간 하면서 하키 선수들을 키우는 데 그야말로 미쳐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았다. 나만 그런게 아니고 주변의 수많은 동료 체육교사들이 승진이나 포상 등을 바라지 않고 그냥 선수들을 키웠다. 봉급도 적었고 수당도 없었고 주당 20여 시간 수업을 했지만 그 때는 정말 그랬다. 88서울올림픽을 몇 년 앞둔 1980년대 초중반에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행복이었다.
1989년 3월에 운 좋게 단국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시원찮은 논문 쓰고 강의 준비와 연구한답시고 그 좋아하는 운동을 한동안 소홀히 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간이 아니라 여유가 없었다.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은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받은 이후 돈 좀 들여서 좋은 라켓과 복장을 자발적, 정식으로 구입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21년 정년을 거쳐 지금까지 테니스는 내 생활의 완전 일부가 되었다.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몇 번 해보고 그 덕분에 대학에서 테니스 강의를 선배로부터 이어받았다.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느라 연구와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떻든 그렇게 스포츠사회학과 테니스는 교수 시절의 이론과 실기 전공 강좌가 되었다. 사실 대학에서 하키부도 육성해 보고 하키 강의도 해 보고 싶었는데 여건 상 쉽지 않았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 테니스를 이제는 대학생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중년의 성인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 가끔씩 평생 첫번째로 잘한 일을 생각해 보면 테니스를 배운 일이었구나 하고 웃는다. 나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와 여러 선후배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재능 기부를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가 한창인 요즘 체육계에서는 모회장이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써가며 봉사하는데 3선을 하면 어떻고 5선을 하면 어떠냐, 그건 순전히 내 맘이라고 TV뉴스에 방영된 내용을 보고 말들이 많다. 평소와 다르게 다소 감정적이었던 같고 이유도 있었겠지만 회장이란 분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다.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단체를 운영하는 수천 억 원 예산의 거의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예산권, 인사권, 운영권, 사업권까지 실질적 최종 결정권자인 회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다.
심지어 단체의 정관과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매우 막중한 권한을 쥐고 있는 회장이 단체로부터 개인 돈 안쓰니까 마치 봉사자인 것 처럼 그렇게 자신을 오해, 포장하면 안된다.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선출직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단체 운영비 거의 전액을 회장이 지원하고 있는 종목 단체 회장들과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이다.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확보에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고 인사권도 거의 없는 지방체육회장들과도 결코 같은 입장이 아니다.
봉사자란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고 말 그대로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사람이다. 선출직과 봉사직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자리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외형적으로 설사 봉사의 형태를 띠더라도 내적으로는 그 어느 상근직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임기와 직분을 성실하게 지키고 수행해야 된다. 특히 수천 억 예산의 95%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 회장이라면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규정을 유리하게 바꿔서도 안되고 또 유리하게 덕을 보려고 해서도 안된다. 그러면 그 단체는 반드시 망가진다. 고인 물이 썪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봉사는 누구나 인정하듯 사실 봉사자 자신에게 가장 행복하다. 가르치는 게 직업일 때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앞서지만 무료 봉사활동은 자유와 만족감이 앞선다. 평생 존경을 받으며 교직에 있던 분들이나 전문직에 있던 분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되돌려 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해 왔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의외로 많다. 처음 문을 두드리기가 망설여지겠지만 일단 한번 발을 내디디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소위 나이 든 전문 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재능 기부 현장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손질이 좀더 적극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한다.
(글 : 강신욱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 본 칼럼의 내용은 헬스인뉴스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